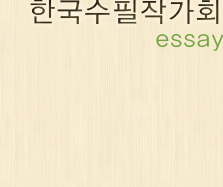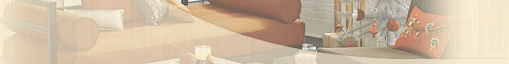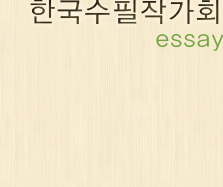삶을 위한 발라드
박 원 명 화(朴貞姬)
글을 쓴다는 것은 내 마음을 살펴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싶은 얘기들과 내 안에 도사린 무지갯빛 꿈들을 하얀 도화지에 아름다운 빛깔로 그려보고 싶은 충동이 일 때, 그때마다 무턱대고 끼적거리던 습성은 이미 십 수 년 전에 앓았던 나의 병(病)이었다.
결혼 이후 생활에 줄곧 쫓기고 사느라 그 병은 완전히 가시게 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망령처럼 되살아났다. 예전의 그때보다 오히려 더 깊이 있게 다가와 오랜 침묵에 묻힌 내 감성을 말없이 흔들어 깨웠다. 견고해진 일상들을 하나하나 모두 허물어 보라고 최촉(催促)했다.
불면(不眠)의 고뇌 속에 수많은 미사여구를 생각하게 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무엇인가 풀어보는, 그렇게라도 허전한 마음을 채우고 싶었다. 계절이 거듭거듭 가고 오는 사이 어느새 지천명(知天命)의 세월을 맞아 겉으로는 모든 게 사위어지는데도 저물지 않는 마음만이 햇덩이처럼 쏟아져 오히려 나의 내면(內面)을 돌아보는 눈은 더욱 환하게 뜨여지니 이는 무슨 조화인가.
생활이 복잡해질수록 물질의 소비가 넉넉해질수록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리송하기만 하던 나. 생각을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잔물결만 출렁대며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보무당당(步武堂堂)하게 살아온 날들. 그러나 후회되지 않은 삶이 누구인들 없을까. 내가 왜 사는가를 묻는 것도 그것이 어떤 절망이나 좌절이 아니라 후회스런 지난날의 탄식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그 불혹의 바람은 결국 문학의 열병으로 도져 호되게 앓게 되었다.
일상 속에서 나름대로 보고 느끼고 생각한 바를 글로 간추려 본다는 것은 자꾸 구겨져 가는 내 순수를 되살리는 보람찬 일이기도 하다. 한 편의 글을 끝맺기까지 썼다 지웠다를 수없이 반복하는 동안 나는 비로소 살아 있는 것 같은 희열을 느꼈다.
어느 날 겁도 없이 글을 써보겠다는 나를 남편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아이들도 ‘웬 작가 엄마?’하며 반신반의의 눈길을 보냈다.
글을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추억의 낡은 필름을 뒤적이게 되고 세월만큼이나 불어난 군살들, 그리고 미래의 소망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삶의 색깔들이 여러모로 드러난다. 어쩌다 한 편의 글을 써놓고 괜찮다 싶어 들여다보면 결국은 주어진 현실의 틀을 맴도는 이야기들일뿐. 내 마음의 문을 닫아 걸어 놓고 속고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는 잘 풀어 헤치면서 고약처럼 가슴에 엉겨 붙은 부끄러운 진실의 고백은 슬그머니 숨겨지기 마련이다. 마치 속내가 벗겨질까 두려워하는 위정자처럼….
‘글이란 무엇인가. 쓰고자 하는 바를 정직하게 정확한 문장으로 구성하는 일이다. 문학적인 문장일수록 함축적인 형상화가 긴요하다. 그 때문에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게 되지만 자칫하면 누더기가 될 수도 있다’ 는 주위를 항상 귀담아듣고 글을 쓸 때마다 환기하고자 한다. 처음의 순수한 내 얼굴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화장을 짙게 하지 않은 그대로의 얼굴이 매력적이듯이.
과식은 소화불량을 불러오듯이 글 쓰는 일도 욕심이 앞서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좋은 글을 쓰려면 우선 생활인으로서 성실해야 한다. 그런 성실 속에서만 문향이 풍겨 나오는 것이 아닐까.
가끔 문우들을 만나 서로의 글을 놓고 합평을 할 때가 있다. 남의 글의 허점은 잘도 보면서 정작 제 글에 대해선 눈먼 장님이 되어 있다.
내가 글을 쓰고자 추구한 것은 잘한 일로 생각된다. 아이들도 그렇고, 주위의 사람들도 그런 의도를 괜찮게 여기고 격려해 주고 있으니 말이다.
오늘도 나는 여전히 새내기 자세로 마음을 다지며 글을 쓴다. 언젠가 비상할 것이라는 소망의 날개를 간직한 채. 마음속 그림자들까지 아름답게 채색할 수 있기를 기다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