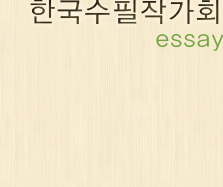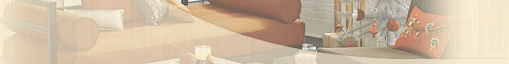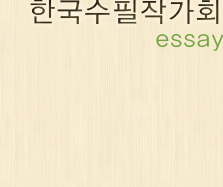한계의 벽을 넘어
이 사 명
내가 수필을 쓰게 된 동기는 학교교지에 글을 써 주었던 때부터였다. 특별한 수필작법이 있다기보다는 나름대로 공부하고 훌륭한 선생님들과의 문학교류를 하면서 수필을 알게 되었다.
전문적인 수필을 쓰려면 적어도 많은 지식과 지혜를 겸하고 고전작품이나 사상전집을 두루 섭렵했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그 중 하나도 갖추질 못했으니 딱한 노릇이다. 그러면서 처음 글을 썼을 땐 겁없이 물에 뛰어들어 물장구를 치는 어린애와 같이 다듬지 않은 글을 발표하곤 했다. 그러던 일들이 민망하고 부끄러워 이제는 많은 퇴고 끝에 작품을 내보내게 된다. 쓰면 쓸수록 어려운 수필에 책임감을 느끼며, 투철한 사명감마저 절감하게 되어서이다.
나는 수필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러나 좋아하는 만큼 문장력의 기교가 따라주지 않는다. 사랑한 만큼 글쓰기의 어려움은 언제나 한계의 벽으로 나를 괴롭힌다. 그런 수필은 나를 수없이 좌절하게 하고 또 궁지에 몰아넣고 얽어맨다. 그 끈은 애증의 끈처럼 단단하지만 사력을 다해 풀어보려 하는 것은 바로 걸작의 수필을 습작해 보려는 갈증에서다. 그러나 그 갈증을 해소하려 자식처럼 아끼고 가꿔서 길러내건만, 자연스럽지 못한 글이 좀처럼 해갈의 기쁨을 주지 못한다.
수필은 체험문학이다. 고백적인 성격이 강한 글이다 보니 소박하고 간결할수록 좋은 수필이라 한다. 무형식 속에서 형식을 취하는 문학이니만큼 자연스러워야 하나 그 자연스러움이 쉽지가 않아 수필이 어렵다고 할 것이다.
무형식의 글이 편안하게 읽힐 수 있는 원숙함은 문장의 격에서 나온다고 본다. 짧은 글 속에나마 하고 싶은 말을 함축해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명문의 편지가 그냥 자유로이 써진 것 같지만, 진실의 실타래에서 풀어져 나오는 서식이 있어서이다. 노래가 물처럼 매끄럽게 흐를지라도 가수의 풍부한 성량과 감정의 기교가 있어야만 히트할 수가 있는 것이다. 수필의 격이 이와 무엇이 다르랴.
글을 쓴다는 것은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의 작업이다. 다른 직업의 일을 해보지만 수필작업을 할 때처럼 힘이 들지는 않는다. 수필 한 작품을 마무리 하려면 내 몸이 거의 탈진되는 느낌을 받게 되어서다. 그러한 작업인데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내가 수필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필을 내 경우엔 우선 구상의 집을 지었다 헐었다 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다 주제가 어느 정도 압축이 되면 제목을 정하고 주제의 줄기를 따라 소재를 찾아 써나간다. 그런 집필 중의 숲 속에선 길을 잃고 본 궤도를 이탈하기가 일쑤다. 풀숲 가장자리를 따라가다 깊은 늪으로 빠지는가 하면 정도의 숲길을 거쳐야 하는데도 엉뚱한 사이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그러하다 결국은 제 자리로 찾아드는 경로를 밟게 된다.
이렇게 어설픈 나의 수필작법은 언제나 정해져 있는 줄긋기 순서와 같다. 연습장에서 밑그림으로 덧칠하면서 시작한다. 처음부터 컴퓨터나 원고지에 쓰지 않는 것은, 길들여진 버릇이지만 서투른 글 솜씨 때문이다. 원고가 잘 풀려나가면 좋겠지만, 대부분 중도에서 막히게 되어서다. 깊은 밤잠을 못 이루며 메모해 둔 제재의 구상도 새벽녘에 눈을 반짝이며 스쳐가던 영감마저 모두 허사가 되고 만다.
그렇게 되면 일단 원고를 덮어둔다. 일 주일이고 이 주일 뒤 다시 첫 원고를 본다. 그럴 때마다 상념의 날개가 엇비껴 날아간 문장,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 등을 읽어보면서 후회스럽기 그지없다. 매양 이 마무리 퇴고를 하면서 나의 수필에 대해 만족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오로지 부족함에 아쉬움만 남는 글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나는 어쩔 수 없이 만족치 못한 글을 마무리 탈고 할 수밖에 없다.
수순의 방법이 잘못되어 글이 안 되나싶어 이 책 저 책을 사다 연구를 해 보았다. 그렇지만 작법만이 꼭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체험과 정감이 어우러져 문학으로 빛을 발하는 글이 수필이다. 그런 글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작가가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 소박하고 진솔하게 열정을 담아 작품에 반영하느냐란 문제에 달린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