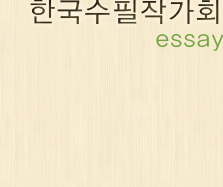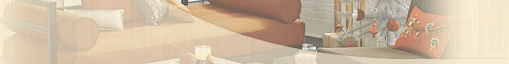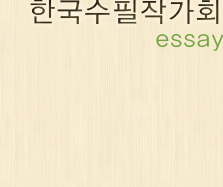해변
바다는 너무 극성스럽고
욕심을 부리고 안달하는 사람들에겐
보답을 베풀지 않는 법,
참을성, 참을성, 참을성-
이것이 바로 바다의 가르침인 것이다.
*A.M.린드버그/신상웅 옮김
바닷가란 독서하거나 집필 혹은 사색할 장소는 아니다. 나는 지난 몇 해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마땅히 그것을 알고 있었어야 했다. 어떤 진실된 심적(心的) 단련이나 정신의 드높은 비상(飛翔)을 즐기기에는 해변은 너무 따뜻하고 축축하고 부드럽다. 그런데서는 사람들은 속수무책이다. 사람들은 기대에 부풀어 책과 원고지와 회답이 너무 늦어진 편지와 심을 잘 다듬은 연필과 작업 목록 그리고 훌륭한 의욕까지를, 색이 바랜 마대(麻袋) 가방에다 툭 불거지도록 잔뜩 집어넣고 그곳으로 간다. 하지만 책장은 들추어보게도 되지 않고 연필심은 부러지고 원고지 꾸러미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고스란히 동댕이쳐져 있다. 책을 읽는다거나 글을 쓴다거나는 물론이고 사색에 잠기는 일마저도 불가능하다 ― 적어도 처음에는 그렇다.
처음엔 지쳐 떨어진 몸이 옴쭉달싹을 못하게 한다. 사람들은 마치 멀미 나는 갑판 위에 올라섰을 때처럼 멍청해서 간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만다. 모처럼의 의욕도, 온갖 조촐한 결심도 어쩔 수 없이 해변의 원시적 일렁임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부서지는 파도, 솔잎을 뒤흔드는 바닷바람, 모래톱 위를 가로지르며 날아가는 왜가리의 느릿느릿한 날개 소리는, 도시의 아우성치는 소음과 빈틈없는 일과(日課), 예정 같은 것을 말끔히 잊어 버리게 한다. 사람들은 마술에 걸려 넋을 잃고 맥이 탁 풀려서는 몸을 늘어뜨리고 엎어지는 것이다. 말하자면 바다가 그렇게 만든 편편한 해변에 드러누워 그 해변과 하나가 되고 만다. 어제의 온갖 어지럽던 흔적이 오늘의 밀물로 말끔히 씻겨진 바닷가처럼 아무런 꾸밈도 없고 탁 트이고 텅빈 마음이 되어.
그러던 2주째의 어느 날 아침, 마음은 잠을 깨고 다시 살아난다. 도시 감각으로가 아니라 ― 아니고말고 ― 해변의 양식(樣式)으로 말이다. 마음은 해변을 간질이는 그 게으른 물결처럼 표류하고, 뛰놀고, 부드럽게 굽이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아무도, 이 한가하게 일렁이는 무념(無念)의 파도가 의식(意識) 있는 마음의 평온한 모래톱에 무슨 우연의 보물을 밀어 올려줄지를 모른다 ―― 그것이 아주 동그란 조약돌일는지, 아니면 깊은 바다 밑으로부터 떼밀려 온 보기 드문 조개 껍데기일는지를, 어쩌면 그것은 소라고둥이나 달고둥, 아니면 배낙지조개일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절대로 그런 보물을 찾아내려 하거나 파내어서는 안 된다 ――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정말이다. 바다 밑을 파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모든 것이 허사가 될 것이다. 바다는 너무 극성스럽고 욕심을 부리고 안달하는 사람들에겐 보답을 베풀지 않는 법. 보물을 찾아 파헤친다는 건 무엇인가. 초조하게 안달하고 탐욕스럽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곧 신념의 결핍을 나타낸다. 참을성, 참을성, 참을성 ―― 이것이 바로 바다의 가르침인 것이다. 참을성과 신념, 사람들은 텅 빈, 시원스레 트인, 허심탄회한 해변 같은 마음으로 바다가 보내는 선물을 기다려야 한다.
*앤 머로 린드버그(Anne Morrow Lindbergh)는 미국 작가, 시인, 수필가이다. 유명한 비행사 찰즈 오거스터스 린드버그 대령의 부인이기도 하다. 이 글은 그녀의 가장 역작으로 알려진《바다의 선물》이란 수필집에 실린 것이며 바닷가에 가면 지천으로 깔려있는 보잘 것 없는 여러 가지 조개들에 관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조그마한 조개를 통해 인간과 자연을 꿰뚫어 보려는 여성 특유의 감수성과 예리한 눈을 발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