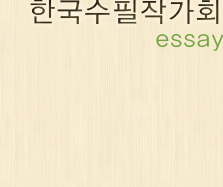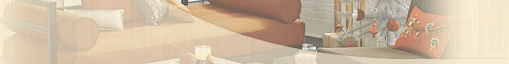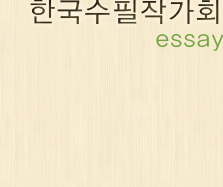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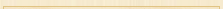 |
|
|
 |
|
|
| 오늘 방문자수 |
     |
| 어제 방문자수 |
      |
| 최고 방문자수 |
      |
| 방문자수 누계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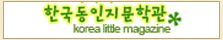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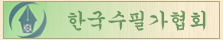
|
|
|
|
|
|
|
|
|
|
| 글쓴이 : 류인혜 |
날짜 : 15-02-11 11:02
조회 : 1860
|
|
|
|
옛 글을 본받되 새롭게 지어라
- 楚亭集序
박지원
문장(文章)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떤 논자는 ‘반드시 옛 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마침내 세상에는 옛것을 흉내 내고 본뜨면서도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생기게 되었다. 이것은 왕망(王莽)이 신(新)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제멋대로 주(周)나라의 관직제도를 모방하여 예악(禮樂)을 제정할 수 있고, 양화(陽貨)가 공자와 얼굴이 닮았다고 해서 만세의 스승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격이다. 옛 것을 어찌 본받을 것인가.
그렇다면 새롭게 지어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침내 세상에는 괴벽하고 허황되게 문장을 지으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가 생기게 되었다. 이는 세 장(丈) 되는 장대가 나라에서 정한 도량형기(度量衡器) 보다 낫고, 이연년의 신성(新聲)을 종묘 제사에서 부를 수 있다는 격이다. 새롭게 지어내기만 해서 어찌 되겠는가.
무릇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옳은가? 나는 장차 어떻게 해야 하나? 아니면 문장 짓기를 그만두어야 할 것인가? 아! 옛 것을 본받는다는 자는 옛 표현에만 얽매이는 것이 병통이고, 새롭게 지어낸다는 자는 법도에서 벗어나는 게 걱정거리이다. 진실로 옛 것을 본받으면서도 능히 변화시킬 줄 알고, 새롭게 지어내면서도 법도에 맞을 수 있다면, 지금의 글이 바로 옛글과 같을 것이다.
옛사람 중에 글을 잘 읽은 자가 있었는데 공명선이 바로 그요, 옛사람 중에 글을 잘 짓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회음후(淮陰侯) 한신(韓信)이다. 이는 무슨 말인가.
공명선이 증자(曾子)에게 배우면서 3년 동안 글을 읽지 않아서 증자가 그 까닭을 물었다. 공명선이 대답하기를,
“저는 선생님이 댁에 계실 때나 손님을 응접하실 때나 조정에 계실 때를 보면서 그 처신을 배우려고 하였으나 아직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면서 감히 선생님 문하생으로 자처하겠습니까?” 하였다.
물을 등지고 진을 치는 배수진(背水陣)은 병법(兵法)에 보이지 않으니 여러 장수들이 복종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회음후는
“이것도 병법에 나와 있다. 단지 제군들이 제대로 살피지 못했을 뿐이다. 병법에 ‘죽을 땅에 놓인 뒤라야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던가?” 하였다.
그러므로 무턱대고 따라 배우지 않는 것을 잘 배우는 것으로 여긴 것은 혼자 살던 노(魯)나라 남자요, 아궁이 수를 늘림으로써 아궁이 수를 줄인 계략을 이어받은 것은 변통할 줄 안 우승경(虞升卿)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하늘과 땅이 비록 오래되었으나 끊임없이 생명을 낳고, 해와 달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그 빛은 날마다 새롭다. 세상에 서적이 아무리 많다하지만 거기에 담긴 뜻은 제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새와 물고기와 짐승과 곤충에는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으며, 산천초목 중에도 반드시 신비스러운 영물(靈物)이 있다. 썩은 흙에서 버섯이 무럭무럭 자라고, 썩은 풀에서 반딧불이 생긴다. 또 예법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음악을 설명하는 데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문자는 말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그림은 뜻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 어진 이는 도(道)를 보고 ‘인(仁)’이라 이르고, 슬기로운 이는 도를 보고 ‘지(智)’라 이른다.
그러므로 백세(百世) 뒤에 성인이 나온다 해도 의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은 앞선 성인의 뜻이요, 순임금과 우임금이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의 말을 바꾸지 않으리라 한 것은 뒷 현인이 성인의 뜻을 계승한 말씀이다. 모든 성인과 어진 이들의 법규는 같을 것이니, 지나치게 소견이 좁거나 또는 지나치게 주견이 없는 태도는 점잖은 사람이 취할 것이 아니다.
박씨집 청년 제운(齊雲, 朴齊家)이 나이 스물 셋인데 문장에 능하고 호는 초정(楚亭)이다. 나를 따라 공부한 지 여러 해가 되었다. 그는 문장을 지으면서 선진(先秦)시대와 양한(兩漢)시대의 작품을 흠모했으나 옛 문체에만 얽매이지 않았다. 하지만 진부한 말을 없애려고 애쓰다 보니 근거가 없는 표현을 쓰는 실수를 범하기고 하고, 내세운 주장이 지나치게 고원하다 보니 법도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바로 이래서, 명나라 때의 작가들이 ‘옛것을 본받아야 한다’느니 ‘새롭게 지어내야 한다’느니 하며 서로 비방하다가, 모두 바른길을 얻지 못한 채 다 같이 말세의 자질구레한 폐단에 떨어졌던 것이다. 나는 바로 이 점이 두렵다. 그러니 새롭게 지어낸답시고 재주 부리기보다는 차라리 옛것을 본받다가 고루해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제《초정집楚亭集》을 읽고서 아울러 공명선과 노나라 남자의 독실한 배움을 논하고, 저 회음후와 우승경의 기이한 책략이 모두 옛 법을 배워서 잘 변통한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밤에 초정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는, 마침내 그 책머리에 써서 그에게 권면하는 바이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