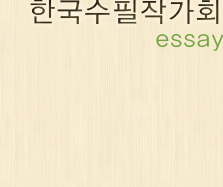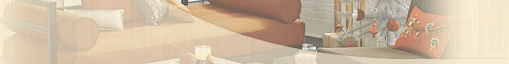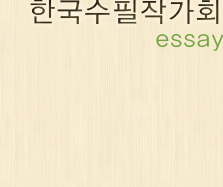수필에 있어서 구성의 요건과 실제
수필은 비교적 짧은 글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중에 자연스레 짜임새가 이뤄진다. 구성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소설, 희곡 등에 비해 의도적인 구성이 요구된다고는 볼 수 없다. 수필에선 비구성적 요소를 특성으로 들기도 했으나, 어떤 장르의 글이든 구성이 필요하다.
수필은 짧은 글이기 때문에 더욱 구성의 효과가 요구될 수도 있다. 수필의 구성에 있어서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마음속에서 글을 쓰는 중에 자연스레 구성이 이뤄지는 경우다.
이 때도 '무구성'이라기 보다는 이미 마음속에서 구성이 이뤄졌다고 보아야 한다. 서두를 어떻게 끄집어내며,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까를 염두에 두고 써내려 가는 동안 자연스레 구성이 이뤄진 경우일 것이다.
둘째, 글쓰기 전에 몇 단계로 나눠 밑그림을 그린 후 쓰는 경우다. 대개 체험과 느낌의 2단계 구성, 서론(서두), 본론(전개), 결론(마무리)의 3단계 구성, 기(起), 승(承), 전(轉), 결(結)의 4단계 구성 등이 보편화돼 있다.
소설과 희곡 등 산문 장르의 경우엔 클라이맥스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수필의 경우엔 오히려 서두와 결미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수필의 구성에 있어서 반드시 생각해 볼 구성상의 요소가 있다면 체험(사실)과 느낌(주관)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일기, 기행문 등에 있어서 사실 그대로를 쓴 것이라면, 기록문에 불과하다. 사실에다 작가의 느낌이 있어야만 문학성을 띄게 된다.
수필은 체험(사실)을 토대로 인생의 발견과 의미를 담는 그릇인 만큼, 어디까지나 작가의 체험이 밑바탕이 되는 것이지만, 문학인 이상 상상, 느낌과 함께 작가의 해석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작가가 겪은 체험담, 에피소드, 일 들을 사실대로만 써 놓은 글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물론 기록문은 그 자체로서 가치성이 있는 것이지만, 문학은 아닌 것이다.
수필에 있어서 체험(사실)과 느낌이 뒤섞여 있지만 조화를 이뤄야 한다.
1. 체험이 많고 느낌이 적을 경우
2. 체험이 적고 느낌이 많을 경우
3. 체험과 느낌이 반씩일 경우
4. 체험, 느낌, 의미부여가 3분의 1씩인 경우
체험과 느낌의 배분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고 할 순 없다. 소재 및 주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작가의 개성과 구성기법에 따라 달리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
는 조화가 있는 쪽이 더 좋은 효과를 얻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①의 경우엔 사실성, 기록성은 강하나 딱딱하고 작가의 감정을 느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②의 경우엔 현장감이 약하고 추상성, 현학성에 빠질 우려가 있다.
③의 경우엔 균형감각과 조화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① ② ③ 의 경우에 있어서도 반드시 간과해선 안될 요소가 있다면 ④의 경우처럼 작가의 인생에 대한 발견과 의미부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가의 삶과 인생에 있어 꼭 기억해야 할 소중한 체험이라고 할지라도 독자들의 인생에 필요한 자료와 의미가 되기 위해선 작가의 발견, 해석, 의미부여가 있어야 한다.
수필에 있어서 얘기 중심의 줄거리수필과 느낌 중심의 이미지수필이 있다.
얘기 중심의 수필인 경우, 하나의 줄거리로 된 것이 있는가 하면, 테마에 따라 2∼3개의 얘기가 동원될 수도 있다.
줄거리 수필에 있어 구성상의 요체는 발단, 전개, 결말 순으로 할 것인지, 결말, 발단, 전개 순으로 할 것인지, 작가의 해석과 의미 부여를 어느 부분에 삽입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미지 수필의 경우에도 분위기, 관찰, 느낌, 맛을 몇 개의 대문으로 나눠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행 수필의 구성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쓸 것인지, 장소에 따라 쓸 것인지, 테마에 맞춰 쓸 것인지, 인상 깊은 체험이나 느낌을 중심으로 쓸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구성의 기법은 작가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좋은 구성의 요건을 생각해 보면 몇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① 자연스런 구성이어야 한다. 의도성, 작의성이 드러나지 않게 물 흐르듯 자연스런 구성이 돼야 한다.
② 평면적인 것보다 입체적인 것이 좋다. 한 가지의 사례나 얘기로서 주제를 부각시키려는 것 보다 복수의 사례나 얘기를 동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전개 방식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서적으로 하는 것보다 경우에 따라선 현재와 과거, 결말과 동기 등을 바꾸어 구성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③ 서두와 결미의 중요성이 소설이나 희곡 보다 더 요구된다.
④ 작가의 인생에 대한 의미부여 부문이 있어야 한다. 수필은 작가의 인생 경지를 볼 수 있는 글이므로 무엇보다 작가의 인생에 대한 발견, 의미부여가 있어야만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필자의 [가을 금관]이란 작품을 사례로 구성의 요건에 대해 살펴본다.
필자의 [가을 금관]은 처음부터 3단계 구성을 시도하여 1,2,3으로 구분하여 놓았다.
이 작품은 어느 해 가을, 온양에서 개최된 수필세미나가 종료된 후 인근에 있는 맹씨행단(孟氏杏壇)을 찾아간 기행문의 형식을 띄고 있다. [수필공원]의 편집 주간을 맡고 계시던 박연구(朴演求)선생이 필자에게 '맹씨행단'을 찾은 소감을 써 달라는 청탁을 받아 응하게 되었다.
맹씨행단은 조선 시대 명재상(名宰相)이며 청백리(淸白吏)였던 맹사성(孟思誠)의 고택(古宅)이 있는 곳을 이름한 것이다.
이곳에 와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고 소재도 각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맹사성에 대한 얘기를 소재로 삼을 법도 하다.
그런데, 필자는 여기서 황금빛으로 물든 수백 년 된 세 그루 은행나무에 빠지고 말았다. 은행나무의 모습이 황금빛의 금관처럼 느껴졌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영원의 시·공에 높이 치솟아 오른 '은행나무'를 통해 살아있는 금관을 보는 듯했다. 이와 같은 느낌은 박물관에서 신라 금관을 보았을 때의 감정과 연관되어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필자는 '은행나무=금관'을 머리에 그리면서 쉽게 구성을 끝냈다.
1
언젠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신라 금관을 보는 순간, 오랫동안 나는 한 그루 황금빛 나무를 연상했었다.
박물관 유리 진열대 안에 들어 있던 천 년 신라 유물들은 대개 시간의 침식에 못 이겨 퀴퀴한 죽음의 냄새를 풍기며 망각 속에 덩그렇게 놓여 있었지만 금관만은 어둠 속에 촛불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생명의 빛깔로 너
무나 선명한 모습으로 살아 있어서 천 년 신라를 말해 주는 촛불처럼 느껴지기만 했다.
나는 우두커니 이 천 년 신라의 황금빛 촛불 앞에 서서 한 그루 나무를 바라보았다. 금관의 출자형(出字型)은 그 형태가 나무의 가지를 본 뜬 것처럼 보였다. 어떤 학자는 사슴의 뿔을 형상화시킨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에겐 나뭇가지처럼 여겨졌다. 그냥 나무가 아니라, 항상 새롭게 싹터서 영원 속에 가지를 뻗치는 무성한 생명력의 나무가 아닐까 생각되었다.
1단락 :박물관에서 신라 금관을 보았을 때 한 그루 황금빛 나무를 연상했었다.(신라 금관 → 황금빛 나무)
2
어느 날, 나는 뜻밖에도 박물관이 아닌 장소에서 금관을 보았다. 황금빛 가지들을 하늘 높이 뻗친 세 개의 금관. 그것은 놀랍게도 아직 내가 보지 못했던 살아 있는 금관이었다. 황금빛 가지가 청명한 하늘로 뻗어 나가 마치 수만 개의 출자형(出字型)을 이루었고, 순금빛 나비형 영락을 달고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하늘이 너무 맑게 열려 있어서 피리를 불면 가장 잘 퍼져 나갈 듯한 가을날이었다. 가을의 한복판에 세 그루의 금관이 하늘 높이 서 있었다. 육백 년 수령의 세 그루 은행나무. 살아있는 가을의 금관이었다. 가을의 찬양이었고 극치였다. 세 그루 은행나무들은 황금 빛깔로 가을의 절정을 그 자신이 가을 금관이 되어 번쩍거리고 있었다. 아직 그토록 장엄하고 화려한 가을 빛깔을 바라본 적이 없었다.
2단락 : 은행나무를 보고 살아 있는 신라금관을 보게 되었다. (은행나무→신라금관)
3
온양에서 열린 수필문학세미나를 마치고 인근에 있는 맹씨행단을 찾기로 했다. 내가 시간을 내어 문학세미나에 참가하는 것은 평소 글로만 익혀 오던 필자들과 만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맹씨행단(孟氏杏壇)은 조선시대 명재상(名宰相)이며 청백리(淸白吏)로 알려진 맹사성(孟思誠)의 고택(古宅)이 있는 곳이다. 이 곳엔 수백년 자란 은행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단(壇)을 쌓았기 때문에 맹씨행단이라 부르고 있다.
맹사성의 고택을 본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수백 년 자란 은행나무와 대면한다는 기대는 자못 설렘까지 동반하고 있었다. 수백 년 자란 은행나무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는 것은 순간의 황홀한 환상이 아닐 수 없었다.
맹씨행단에 도착하여 육백 년 수령(樹齡)의 세 그루 은행나무와 만났다.
3단락: 은행나무를 보게 된 배경, 수필세미나 후의 맹씨행단 구경과 감상,(은행나무 → 신라금관 → 맹씨행단의 가을)
필자의 [가을 금관]에 시도된 3단계의 서두를 보면 뚜렷하게 구성의 요소를 엿볼 수 있다.
맹씨행단(孟氏杏檀)에 와서 세 그루 은행나무가 빚는 가을 교향악을 들었다. 나에게도 한 순간이나마 은행나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의 순간이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은행나무는 가을 금관이 되어 육백 년의 명상과 노래를 천지 사방에 마구 뿌리고 있었다.
위 부문은 [가을 금관]의 결미로서 다시 한 번 은행나무와 금관을 결부시켜 가을의 정경을 심화시키려 했다.
수필에 있어서 글을 쓴 동기부문이 서두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을 금관'은 <금관 = 은행나무 = 가을 금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동기 부문을 끝부분에 배치시켰다.
수필에 있어서 '무기교 무구성'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대목은 수필의 자유스러움과 자연스러운 면을 강조하려는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짧은 글인 수필에 있어선 구성의 요소가 더욱 필요한 게 아닌가 한다. 구성
이 없는 글은 조화, 감동이 덜하며 어딘지 부조화, 군더더기가 느껴지고 덜 깔끔하고 완성도가 미흡한 것을 엿보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