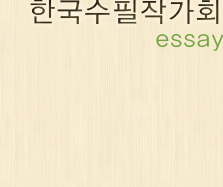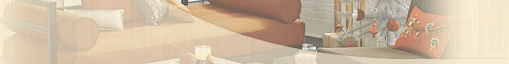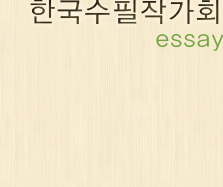|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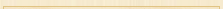 |
|
|
 |
|
|
| 오늘 방문자수 |
     |
| 어제 방문자수 |
     |
| 최고 방문자수 |
      |
| 방문자수 누계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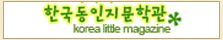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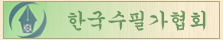
|
|
|
|
|
|
|
|
|
|
| 글쓴이 : 이방주 |
날짜 : 04-01-28 13:49
조회 : 2328
|
|
|
|
박용래의 시 <연시>로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질투다. 한겨울 눈 속에서나 쓰는 하얀 벙거지를 쓰고 사진 속에서 씽긋 웃고 있는 그가 감을 얼마나 알고 있단 말인가? '여름날 땡볕이 가을 햇살에 연시(軟枾)가 되어 겨울에 제상(祭床)의 조율이시(棗栗梨枾)의 한 자리에서 빛난다'는 식의 시의(詩意)의 전개가 자연은 인생의 한 뿌리라는 오묘한 이치를 소화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어린날을 온통 고욤나무와 감나무 숲에서 함께 자란 알량한 나의 자존심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이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감'을 좀더 가까이 맛보게 하려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교과서 그림보다 좀더 풍성한 그림을 찾아보라고 했다. 선이가 나와서 인터넷 검색을 하는 동안 나는 창 너머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어린날 날마다 보아도 가슴 울리던 고향집 감나무를 그렸다. 내 기억의 따뜻한 언덕에 서있는 감나무는 지금쯤 다른 나무보다 먼저 상순까지 낙엽을 끝내고 발갛게 익은 감만 소복하게 매달고 있었다. 그런데 나보다 더 하늘거리는 감성을 지닌 선이는 선생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감나무를 어느새 찾아내어 아이들은 환호를 올렸다.
어떤 귀여운 녀석이 '먹고 싶다.'고 소릴 질러서 모두 웃었다. '아가야, 감은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아무리 잘 익은 감이라도 떫은맛이 있기 때문이다. 뜨거운 물에 하루 밤쯤 담가서 떫은맛을 우려내야 단 맛만 남아서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떫은맛을 우려낸 재래종 원시(圓枾) 맛은 질곡을 넘어서 원시(元始)의 맛 그대로이다.
감나무는 여느 나무들보다 먼저 물들이기를 시작한다. 여린 감나무는 그만큼 추위를 타기 때문이다. 또 그 물들이기는 어떤 나무 못지 않게 화려하다. 감나무는 서산에 비끼는 가을 햇살이 기울기를 더하면서 바라보는 이마에 바늘이 꽂히듯 따가울 때 아랫도리에 난 가지는 벌써 엽면(葉面)에 반짝반짝 윤이 나기 시작한다. 잎새의 가장자리가 또르르 노랑으로 테를 두르면, 그의 얼굴에는 군데군데 노랑 반점이 생긴다. 실핏줄 같은 짙은 녹색의 잎맥이 눈에 띌 때쯤에는 이미 노랑은 빨강으로 변하고 노랑 반점은 녹색 반점과 자리를 바꾼다. 잎맥이 녹색의 빛을 잃으면 잎몸은 모두 빨강이 되고 잎자루까지 노랑이 된다. 옆면에 윤기가 더하면 작은 바람에도 살랑거리지 못하고 낙엽이 된다.
감나무가 낙엽을 시작하면 푸름 속에서 남몰래 붉어가던 감이 얼굴을 드러낸다. 열매의 물들이기의 시작은 잎새의 물들이기보다 화려하지 못하다. 꼭지에서 먼 부분부터 녹두색으로 엷어지다가 노랑이 된다. 꼭지는 더욱 단단해지고 과일을 감싸고 있던 작은 잎이 점점 윤기를 잃고 말라갈 때는 감은 흐릿한 분을 바르고 완전히 분홍이 된다. 나무가 삼분의 이쯤 낙엽을 하고 그 나신(裸身)을 드러내면 열매는 옷고름을 꼭 그만큼만 풀고 가슴을 드러내는 여인의 얼굴처럼 발갛게 익는다.
잎새의 물들이기에 비해 꼬질꼬질할 것 같던 열매의 물들이기는 가을의 녹의홍상(綠衣紅裳)의 고름을 풀면, 햇살의 따가움이 영글어 터질 것같이 부푼 속살을 드러낸다. 감은 이렇게 열매가 익어가면서 내면을 채운다. 무서리가 내리면 껍질의 희미한 분가루가 없어지면서 더 얇아지고 윤기가 흐른다. 그 때 나무는 녹의(綠衣)도 홍상(紅裳)도 훨훨 벗고 목마른 중생에 젖을 물리듯 세월을 넘어선 여인이 된다.
그러나 땡감을 그냥 먹을 수는 없다. 떫은맛을 우려내야 한다. 땡감을 그냥 먹었다가는 목이 메고 입안이 뻑뻑하고 그야말로 '땡감 씹은 기분'이 된다. 감의 떫은맛은 '탄인'이라든가 하는 성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길 언뜻 들었다.
원시(圓枾)의 '떫은맛 우려내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들 하지만, 옛날 어머니의 손이 가면 하루밤 사이에 그 떫은맛이 다 우려져 단감이 되던 것이 생각난다. 어머니는 뜨거운 물에 소금을 약간 타서 바가지로 아주 뜨거운 김을 날려보낸 뒤 땡감이 가득한 항아리에 기도하시는 정성으로 부었다. 그리고 헌 이불을 덮어씌워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신다. 이튿날 새벽이면 감 맛을 보는데 껍질이 약간 찝찔하지만 속살은 꿀맛이었다.
그런데 떫은맛 우려내기는 꼭 열탕에 담그기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언젠가 첫눈이 너무 일찍 내려서, 미처 수확할 사이도 없이 발간 감 위에 소복하게 흰 눈이 쌓인 적이 있다. 그 아름다움을 보고 나는 탄성을 올렸지만, 어머니는 애석해 하셨다. 언 감은 곶감 만들기도 어렵고 단감을 만들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연시로나 만들어야 한다.
언 감은 우려내기를 하지 않아도 단맛이 된다. 오히려 우려내기를 한 것보다 더 단맛을 낸다. 그러면 그것은 '우려내기'가 아니었단 말인가? 나는 그 후에 그건 우려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수용성인 탄인 성분이 고온이나 냉온에서 불용성 탄인 성분으로 변하여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
고향집에 지천으로 둘러있는 감도 결코 수수한 과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씨를 뿌려도 제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반드시 접을 붙여야 하는 것도 그렇고, 열매가 예사롭지 않은 색깔로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해도 바지에 쓱쓱 문질러 한입으로 물어 뗄 수 없는 것도 그렇다.
감은 어떻게 떫은맛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떫은맛을 감출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입안에 떫은맛을 지니고 살면서 떫은 그 말 한마디로 일상의 수고를 모두 도로(徒勞)로 만들어 버린다고 사랑하는 후배 동료들에게 쓴맛 같은 충고를 많이 들어왔다. 나도 입안에 떫은맛을 감출 수는 없을까? 가지고 있는 것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보이지 않도록 감추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말이다.
반드시 침을 삼키며 참고 기다려야 오묘한 맛을 보여주는 감이 부럽다. 아니 떫은맛을 감추는 것이면서도 우려내기를 하는 것이라고 오랜 세월 진실을 가려온 그 엉큼함이 더 부럽다.
(2002. 11. 17.)
|
|
| 최루시아 |
03-11-30 00:00 |
 |
|
'호박 같은 아내'를 읽었을 때도 느낀 점이지만, 선생님께선 어쩜 이렇게 글을 맛있게 쓰실까요?부럽습니다.저 역시 어린 시절을 고욤나무와 감나무 그늘 아래서 보낸 추억이 있기에 이 글을 읽노라니 어느새 마음은 고향집 마당에서 놀고 있네요.항아리에 넣어둔 고욤을 한 겨울 긴긴 밤에 꺼내어 먹어 보셨지요? 그 달콤하면서 시린 맛을 언제 다시 맛볼 수 있을지요? 좋은 글 또 기다리겠습니다. -[01/28-22:27]<br>- <hr size=1 color=#eeeeee width=95%> <br>
|
|
|
|
| 이방주 |
03-11-30 00:00 |
 |
|
</a> 떫은 감은 오래 씹어도 단맛으로 변한다는 어린날의 기억이 글을 쓴 다음에 떠올랐어요.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모릅니다. 오래 씹으면 말도 달아지는 것을 ----- <br> 그러나 이미 발표된 글이라 더 보태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색이 어디까지 미쳐야 완벽한 글을 쓸 수 있을까요. 그걸 생각하면 참으로 차분하지 못한 느림보인 저 자신을 마구 두들겨 패고 싶었습니다. -[01/29-05:53]<br>- <br>
|
|
|
|
|
|